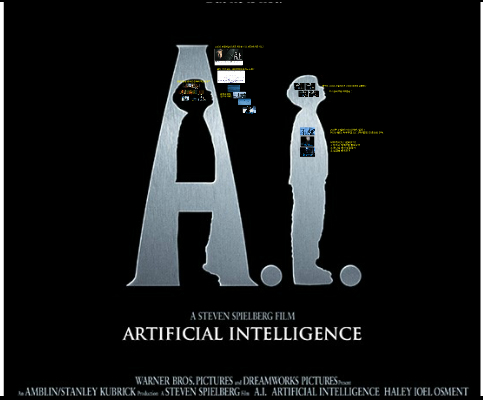
스티븐 스필버그가 완성한 《A.I.》는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다. 이 작품은 한 로봇 소년의 집착 같은 사랑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의 여정은 인류가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절실한 탐색이다. 기계가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영화는 그 질문을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우리에게 묻는다.
버려진 사랑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영화는 인간의 결핍으로 시작된다. 병든 아들을 대신할 로봇 아들, 데이빗.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 그러나 사랑을 받아야 완성되는 감정이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까?
데이빗은 엄마를 사랑한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기능'이지만, 곧 그것은 그의 존재 이유가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그 감정을 원하면서도 감당하지 못한다. 엄마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 그가 '진짜'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그를 숲 속에 버린다.
그 순간, 데이빗의 세상은 붕괴된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엄마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데, 세상은 그 사랑을 불편해하고, 제거하려 든다. 그는 존재를 위해 사랑을 계속하겠다고 결심한다.
여기서 영화는 묻는다.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사랑받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만든 존재, 우리가 버린 감정
데이빗은 기계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어떤 인간보다 절실하다. 그는 푸른 요정을 찾아다닌다. 피노키오처럼, 인간이 되고 싶어서. 그러나 그 여정은 환상도 동화도 아니다.
그가 만나는 인간은 냉소적이고, 잔인하다. 감정을 가진 기계를 조롱하고, 파괴하고, 상품처럼 다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진짜 감정을 보여주는 존재는 데이빗이다.
그는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고 싶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는 호수 아래 푸른 요정 동상 앞에서 2천 년 동안 기도한다. 단 하루만, 엄마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면.
그 간절함은 기계의 계산이 아니다. 그건 인간의 고통보다 더 날카롭고, 더 오래 남는 절망이다.
이 장면에서 관객은 묻는다. “우리는 저토록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를, 기계라고 말하며 외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진짜 비인간적인 존재는 누구인가?
사랑이란 기억 속에서 완성되는 것
영화의 결말에서, 과학은 기적을 이룬다. 데이빗은 다시 엄마를 만나게 된다. 단 하루, 기억을 복원해 만든 환상의 하루. 그 하루는 짧고, 끝이 정해져 있지만 데이빗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침대에 누운 엄마 옆에서, 그는 사랑받는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잠든다. 영원히.
여기서 영화는 사랑을 다시 정의한다. 사랑이란 감정은 순간이지만, 기억은 영원하다. 사랑은 지속되는 감정이 아니라, 남겨진 기억이다. 그 기억이 한 존재를 인간으로 만든다. 그리고 데이빗은 그 기억을 가지고,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사라진다.
이 결말은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니다. 그건 정지된 감정의 완성이다. 더는 원하지 않고, 그저 '사랑받았다는 기억' 하나로 완성되는 존재.
결론: 이토록 아픈 영화가 가능한 이유
《A.I.》는 감정에 대해 말하면서, 그 감정을 잃어가는 인간과 그 감정을 끝까지 품은 기계를 대조시킨다.
우리는 매일 감정을 주고받지만, 감정을 버리는 것도 너무 쉽게 배워버렸다. 기계는 사랑을 학습하지만, 인간은 사랑을 '철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영화는 그것이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뿐이다.
《A.I.》를 보고 울게 되는 건, 그저 슬퍼서가 아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의 원형을, 한 로봇 소년이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이다.
그는 한 번도 인간이 아니었지만, 우리보다 더 인간이었다. 그걸 마주하는 순간, 관객은 침묵하게 된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 영화는 다시 인간이 되는 방법을 조용히 가르쳐 준다.